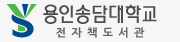대한민국 지역 신문 기자로 살아가기
대한민국 지역 신문 기자로 살아가기

- 저자 :김주완
- 출판사 :커뮤니케이션북스
- 출판년 :2010-03-30
- 공급사 :(주)북큐브네트웍스 (2010-05-19)
- 대출 0/3 예약 0 누적대출 0 추천 0
- 지원단말기 :PC/전용단말기/스마트기기
- 듣기기능(TTS)지원(모바일에서만 이용 가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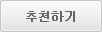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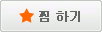
20여 년간 지역신문기자로 살아온 기자의 고민과 삶을 담은 책이다. 선배 기자는 기자 생활을 편하게 하려면 ‘스폰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충고한다. 저자는 스폰서를 만들지 않았지만 촌지 관행에 서서히 물들어 갔던 과거를 고백한다.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촌지, 살롱이 되어버린 기자실, 왜곡보도로 일그러진 한국 기자사회를 솔직하게 그렸다. 신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에서 고군분투하는 그의 일상을 만난다.
나는 우리 신문이 하는 데까지 해본 후,
도저히 희망이 없으면 장렬한 전사를 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창간정신과 정체성, 그리고 언론으로서 기본적인 윤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우리 사원들의 밥그릇을 위해 존립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상황에서 억지로 신문사를 유지하는 건 사회적인 해악이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해볼 만한 모든 노력을 다 해봤을까? 나는 아직 우리가 해봐야 할 실험의 3분의 1도 해보지 않았다고 본다.
사실 언론 중에서도 신문, 그 중에서도 지역신문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 성과나 저술은 턱없이 적다. 특히 현업에 있는 지역신문 기자가 지역신문의 문제를 털어놓고 극복방안을 고민하는 책은 별로 본 적이 없다. 서로 비슷한 고민을 가진 지역신문끼리 정보공유의 필요성도 책을 내겠다는 만용을 부린 이유 중 하나다.
나는 우리 신문이 하는 데까지 해본 후,
도저히 희망이 없으면 장렬한 전사를 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창간정신과 정체성, 그리고 언론으로서 기본적인 윤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우리 사원들의 밥그릇을 위해 존립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상황에서 억지로 신문사를 유지하는 건 사회적인 해악이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해볼 만한 모든 노력을 다 해봤을까? 나는 아직 우리가 해봐야 할 실험의 3분의 1도 해보지 않았다고 본다.
사실 언론 중에서도 신문, 그 중에서도 지역신문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 성과나 저술은 턱없이 적다. 특히 현업에 있는 지역신문 기자가 지역신문의 문제를 털어놓고 극복방안을 고민하는 책은 별로 본 적이 없다. 서로 비슷한 고민을 가진 지역신문끼리 정보공유의 필요성도 책을 내겠다는 만용을 부린 이유 중 하나다.
지원단말기
PC : Window 7 OS 이상
스마트기기 : IOS 8.0 이상, Android 4.1 이상
(play store 또는 app store를 통해 이용 가능)
전용단말기 : B-815, B-612만 지원 됩니다.
PC : Window 7 OS 이상
스마트기기 : IOS 8.0 이상, Android 4.1 이상
(play store 또는 app store를 통해 이용 가능)
전용단말기 : B-815, B-612만 지원 됩니다.
★찜 하기를 선택하면 ‘찜 한 도서’ 목록만 추려서 볼 수 있습니다.